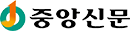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모범생으로 컸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주욱.
우등상을 탔고, 개근상을 탔으며, 칭찬을 들었고, 착한 학생으로 컸다. 그렇게 크다 보면 훌륭한 어른이 될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게 싫었다. 악동이 되고 싶었으며 모범생으로 커서 왜소하고 쩨쩨한 인간-좁쌀영감 되는 게 싫었다. 대범하고 진취적이며 과감한 모험을 불사하는 빅맨(Big man)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모범생을 포기하기로 했다. 모범생을 포기하려면 모범생으로 가는 조건들을 버려야 한다. 그 조건들을 야금야금 버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글씨 잘 쓰는 게 소원이었다.
잘 쓰는 애들이 부러웠다. 언젠가 어느 선생이 칠판에 글을 쓰면서 “글씨는 유전이지요” 하며 자기 글씨가 엉망인 것을 합리화하는 소릴 듣고 맞는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맞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거기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글씨를 못쓰는 법이야” 하는 말을 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냐. 그 말에 적극 동조했고 실천에 옮겼다.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고 받아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써내느냐가 문제인데 글씨야 엉망인들 어떠랴. 아니 어쩌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기 위해서 엉망진창인 글씨를 쓰려 노력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병이 되어 지금도 글씨는 젬병이다. 누군가 내 글씨를 보고 “이 글씨는 악필이야” 한 후로 글씨 잘 쓰기를 포기했다. 내가 버린 모범생으로 가는 조건 제1의 길이었다.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그냥 모범생이었다. 매일 착한 학생으로 선생님 칭찬 듣는 게 나의 학교 생활의 전부였다. 그런 내가 싫었고 건달 학생이 되고 싶었고 일탈을 일삼는 불량 학생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수하手下에 제자 두서너 명밖에 되지 않아 시 답지 않았는지 태권도 사범이 지도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도 오래가지 못했다.
다만 잠깐 동안의 태권도가 나의 자신 없는 일상에 힘을 주었다. 나보다 키 크고 힘 센 아이들에게 겁도 없이 대들어 싸움질을 거는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았으니 배짱 하나는 쓸 만했다.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생겼으니 꽤 괜찮은 무도武道였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좋았다.
힘도 없고 싸움질도 시원찮은 놈이 배짱이라도 생겼으니 움츠리고 살던 세상 다리 뻗고 편히 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악동이 되었고 내가 버린 모범생 포기 제2의 길이었다.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 학기 첫날, 아니면 어느 특별한 기념일이면 일생의 계획, 또는 일 년의 계획 아니면 단기 계획을 세워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런데 잘 실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 계획을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세우고 악전고투하며 실행에 옮기지만 이삼 일 지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맹세만 하다가 흐지부지 잊어버 리고 말았다. 항상 계획은 그렇게 유야무야해졌다. 그래서 약이 올라 숫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런대로 살아. 그래도 잘 살잖아. 이렇게 계획 세우기를
포기하면서 나의 제3의 모범생으로 가는 길을 버렸다.
일생을 중요한 인생의 하루하루라고 생각했다. 훈련병 시절 배가 고팠다. 밥 한 번 많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생일이었다. 생일이라고 하면 야박하게 하지 않겠지. 가끔 생일인 훈련병을 호명해 밥을 수북하게 퍼준적도 있었으니 나도 많이 주겠지 하고 취사병에게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했더니 “뭘 부탁 해. 밥 깎는 거” 하며 밥을 푹 퍼 담았다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싹 깎아내렸다. 개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울분을 눌러가며 생일 밥 한 덩어리를 씹으며 내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란 걸 알았다. 그 후 내 인생 별거 아니다, 곱씹으며 살았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특별한 애착심을 버렸다. 따라서 내 인생은 언제나 홀대를 받았다. 내가 버린 모범생으로 가는 제4의 길이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사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고 슬금슬금 악과 뒹굴게 되었으며 대강대강 살아가는 필부필부가 되었다. 세상 깐깐히 살아 봤자 피곤했고, 모른 체 살다 보니, 깨끗했던 내 몸 더러워졌으며 단정했던 나의 행실은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도덕 교과서라 칭찬받던 나의 몸에 슬금슬금 시정잡배들의 행동거지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정의를 잃어버리면서 살았다. 이게 내가 버린 모범생으로 가는 제5의 길이었다.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모범 포기의 길이 꽤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모두 합쳐 내가 버린 모범생으로 가는 제6의 길이라고 명명하자.
그렇게 버리고 나니 자유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으니 편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니 즐거웠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 살기 편했다. 이렇게 나는 내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 끝 마당에 섰다.
뒤돌아본다. 나는 잘 살았는가. 아니다. 내가 버린 모범생으로 가는 조건들은 인간 조상대대로 유전하던 모범생들 최고의 답안들이었으며 최고의 인간이 되는 첨단의 길이란 걸 뒤늦게 알았다. 돌이키기엔 늦었다. 내가 버린 조건들,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알수 없는 마약 한 개비씩 피우는 것만 같았다. 담배나 마약을 한다는 것은 한순간 쉽게 넘어가지만 끊는다는 것은 일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다. 끊는다는 것은 여간 힘 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근처에도 가지말 일이다.
요즘 세상은 내가 버렸던 걸 버리라고 강요한다.
뛰지 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리게, 느려 터지게.
공부 못하는 애 기죽지 않게 우등상은 몰래 주라고 한다. 옛날 같으면 도태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추기고, 질주와 경쟁은 포기해도 돼.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내가 꽤 앞서 달린 것만 같다. 이러면 안되는데.